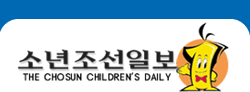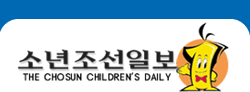|
홈 > 재미있는 공부 > 신기한 과학나라 >
과학자 이야기
최무선
1. 생애와 업적
 고려말의 장군이자 무기 발명가.
고려말의 장군이자 무기 발명가.
본관은 영주(永州:지금의 영천)이며, 광흥창사 최동순(崔東洵)의 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화약과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처음으로 제작하고 사용하였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던 최무선은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화약을 만들고자 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화약 제조법을
알고 있었으나 철저히 비림로 하고 있었다. 최무선은 초석에 황과 숯가루를 알맞게 섞어서 화약을 만든다는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화약 제조법을 알고 있는 원나라 사람 이원을
만나 집에 머물게 하고 우대하면서 화약 제조법을 배웠다.
실험해 본 결과 자신감을 얻은 그는 화약과 각종 화약을 이용한 무기에 대해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여러 번의 건의 끝에 허락을 받아 1377년(우왕 3)부터 화약과 무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화통도감에서 화약을 만들고 화기를 제조하는 한편, 이를 실을 전함(戰艦) 건조에도 힘썼다. 화통도감에서 만들어진 각종
화기들(대장군(大將軍)·이장군(二將軍)·삼장군·육화석포(六火石砲)·화포(火砲)·신포(信砲)·화통·화전(火箭)·철령전
등)은 18가지인데, 이들은 총포류, 발사물, 주화로 분류할 수 있다. 1380년에 왜구가 쳐들어오자 부원수가 되어,
그 화기들을 사용하여 적함 500여 척을 전멸시켜 그 공으로 영성군이라는 벼슬에 올랐다.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하자
여러 벼슬을 지냈고 세상을 떠난 뒤에 우의정 의 벼슬이 내려졌으며, 영성 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저서로 《화약수련법》이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2. 화약 자체 생산
 일찍부터
관리들은 전투에서의 화공의 효과를 크게 인식하여 방화의 목적으로 가연성 물질을 전투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견고한 적의 요새, 또는 집결된 적의 병마에 풍향을 이용하여 화공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화살 끝에 가연성 물질을 부착하여 적진에 날려 보내는 화공법도 흔히 사용되어 왔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공법은
단순한 연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파괴효과는 적었기 때문에 연소효과와 더불어 파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의 개발은
위정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비행무기인 돌의 경우에도 돌이 가하는 단순한 충격효과보다는 파괴력이 수반되는 보다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탐구심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폭발력과 가연성을 지니며 폭발력을 이용하여 공격적
물질을 보다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물질 즉, 화약의 제조에 인류는 역사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중국의 송대에는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3세기 후반에 걸쳐 화약을 제조하여 이를 이용한 화기를 실용의 단계까지 끌어 올려놓다. 초기의
화약의 제조와 화기의 사용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화약 중에서도 주요 성분의 하나인 염초의 제조는 폭발의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때까지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던 화기 주조술은 화약의 폭발력을 감내할 만큼
견고한 화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포신은 자주 파열되었으며 사용자의 희생이 뒤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기의 음향 효과,다시말해 화약이 폭발할 때의 굉음이 적의 말에게 주는 충격이 컸고, 또 인력에 의존하는 재래의 궁시에
비해 살상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 화포의 발사시에 일어나는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화기의
사용은 화약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세기 중엽에 와서야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숙종 9년(1104)에 고려가 북쪽의 여진을 대규모로 정벌하였는데, 이때 발화 대라는 특수부대가 편성
운용 되었고, 발화대가 재래식 화공부대인지, 혹은 화기를 장비한 부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중국대륙을 진척시키고
있던 몽고군이 이미 화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몽고군과의 교섭이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인들은
적어도 화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고려가 보다 확실하게 화기를 사용한 시기는 고려사에 잘 나타나
있다. 공민왕 5년(1356) 9월 고려의 중신들은 서북면방어군을 사열하고, 총통 즉 화기를 이용하여 화살을 사격했다는
기록을 남겨 놓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늦어도 14세기 후반부터는 화기를 제작하여 실전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기의 사용이 곧 화약의 자체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수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양권은 이미 금속활자
문화의 단계에 있었으므로 화기의 주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화약을 어떻게 제조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화기의
효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던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화약의 제조 법을 극비에 붙여 그 기술의 국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가보다도 우세한 무기체계를 유지하려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화약의 성분인 유황, 목탄, 염초의
세 가지 중 유황과 목탄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염초만은 화학적 기술로써 제조할 수밖에 없었다. 실로 화약의
제조는 이 염초의 제조 여하에 그 열쇠가 달려 있었다. 일찍부터
관리들은 전투에서의 화공의 효과를 크게 인식하여 방화의 목적으로 가연성 물질을 전투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견고한 적의 요새, 또는 집결된 적의 병마에 풍향을 이용하여 화공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화살 끝에 가연성 물질을 부착하여 적진에 날려 보내는 화공법도 흔히 사용되어 왔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공법은
단순한 연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파괴효과는 적었기 때문에 연소효과와 더불어 파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의 개발은
위정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비행무기인 돌의 경우에도 돌이 가하는 단순한 충격효과보다는 파괴력이 수반되는 보다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탐구심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폭발력과 가연성을 지니며 폭발력을 이용하여 공격적
물질을 보다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물질 즉, 화약의 제조에 인류는 역사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중국의 송대에는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3세기 후반에 걸쳐 화약을 제조하여 이를 이용한 화기를 실용의 단계까지 끌어 올려놓다. 초기의
화약의 제조와 화기의 사용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화약 중에서도 주요 성분의 하나인 염초의 제조는 폭발의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때까지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던 화기 주조술은 화약의 폭발력을 감내할 만큼
견고한 화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포신은 자주 파열되었으며 사용자의 희생이 뒤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기의 음향 효과,다시말해 화약이 폭발할 때의 굉음이 적의 말에게 주는 충격이 컸고, 또 인력에 의존하는 재래의 궁시에
비해 살상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 화포의 발사시에 일어나는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화기의
사용은 화약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세기 중엽에 와서야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숙종 9년(1104)에 고려가 북쪽의 여진을 대규모로 정벌하였는데, 이때 발화 대라는 특수부대가 편성
운용 되었고, 발화대가 재래식 화공부대인지, 혹은 화기를 장비한 부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중국대륙을 진척시키고
있던 몽고군이 이미 화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몽고군과의 교섭이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인들은
적어도 화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고려가 보다 확실하게 화기를 사용한 시기는 고려사에 잘 나타나
있다. 공민왕 5년(1356) 9월 고려의 중신들은 서북면방어군을 사열하고, 총통 즉 화기를 이용하여 화살을 사격했다는
기록을 남겨 놓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늦어도 14세기 후반부터는 화기를 제작하여 실전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기의 사용이 곧 화약의 자체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수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양권은 이미 금속활자
문화의 단계에 있었으므로 화기의 주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화약을 어떻게 제조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화기의
효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던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화약의 제조 법을 극비에 붙여 그 기술의 국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가보다도 우세한 무기체계를 유지하려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화약의 성분인 유황, 목탄, 염초의
세 가지 중 유황과 목탄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염초만은 화학적 기술로써 제조할 수밖에 없었다. 실로 화약의
제조는 이 염초의 제조 여하에 그 열쇠가 달려 있었다.
3. 화약 제조법

14세기 말에 최무선이 화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오랜 노력 끝에
화약제조에 성공하여 그 제조법을 책으로 남겼지만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아들 최해산(崔琢山)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그 제조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대량생산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그 제조 방법의 화학적인 공정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에
조선에서는 화약 제조 공정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인조 13년 (1635년)에 쓰여진 이서(李構)의 「신전자취염초방」은
우리에게 그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 새로운 방법은, 군관인 성근(成根)이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로 알아낸
것인데, 그것을 병조판서로 있던 이서가 15개의 공정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성근의 초석제조의 기본 원료는 역시 흙이다.
가마 밑에 있는 흙, 마루바닥 밑의 흙, 담벽 밑의 흙 또는 온돌 밑의 흙을 긁어내서 쓰는데, 그 흙맛이 짜거나 시거나
또는 달거나 쓴 것이 더 좋다고 했 다. 이제 이 흙과 따로 준비한 재와 오줌을 섞는다. 이렇게 섞여진 흙을 말똥으로
덮는다. 말똥이 마르기를 기다려 거기에 불을 붙여 태운다.그 흙을 다시 잘 섞어서 나무통 속에 퍼담고 물을 붓는다.
화약을 장전. 발사할 수 있게끔 고안된 조선시대 차차의 총통기(統筒機) 용액을 가마에 넣고 끓이기를 세 번 거듭하고
식혀서 초석 (硝石) 을 결정시킨다.이때 남은 용액과 남은 흙은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쓰도록 했다.
이것이 성근의 초석제조 방법이다. 이서는 이렇게 해서 초석을 만들며 기술자 3명, 잡역부 7명이 1 개월에 1천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흑색화약을 만드는 다음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러니까 화약성분의 혼합비례와 그 처리법은
전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초석과 화약 제조 방법의 보다 더 뚜렷한 발전은 성근보다 약 반
세기 뒤인 1698년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역관(譯율) 김지남(金指南) 이 사신들과 함께 중국에 왕래하면서 얻은 중국
화약 제조법의 비밀을 연구하여 새로운 효율적 방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의 「신전자초방J은 화약 제조 과정을 10개
공정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 원료는 역시 흙이지만, 종전과 같이 특정한 곳의 흙뿐만 아니라 길바닥의
흙도 이용하게 하였고 맵거나 달거나 쓴 흙은 괜찮지만 짠맛이 나는 것은 습기를 쉽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했다. 또 하나의 원료인 재는 쑥이나 볏짚을 태워 만든 것이 제일 좋고 잡초나 잡목을 태운 것도 쓰지만 소나무재는
쓸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흙과 재를 같은 부피의 비율로 섞는다(열 말씩) 이때 흙이 점성이 강한
것일 때는 재를 한 말쯤 더 섞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일 때는 재를 한 말 적게 섞는다. 이제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린 독 안에 정자형 (井子型)으로 나무를 얼기설기 놓고 그 위에 발을 깔고 혼합된 원료를 고루 펴고 물을 부어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가마에 넣고 끓인다. 끓일 때 아교를 첨가한다. 이 공정은,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기본적 (원리적)으로
종전의 방법에서의 그것과 같은 것이지만 훨씬 그 과정이 간략해졌다는 것이 특히 다른 점이다. 이 책은 또 하나의 과정,
즉 흑색 화약의 제조법을 밝히고 있다. 화약은 염초 1근과 버드나무재 3량, 고운 황가루 3돈중을 섞어서 만들였다.
이것은 염초와 재와 황의 조성비를 78:15:7로 하고 있다. 이 비율은 현재 화약을 만드는데 대충 6:1:1의 비율로
섞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이 혼합물을 쌀 씻은 맑은 뜨물로 반죽하여 방아에 찧어서 떡과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이
공정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흑색 화약의 제조법과 매우 비슷하다.
이 「신전자초방」의 저자는, 이렇게 만든 화약은 10년이 지나도 습기가 끼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원료인 흙과 재가
종전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질은 상당히 우수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 Top
|